ABOUT
짧은 찰나에 담긴 세계

이미지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ngudae3.jpg
저작권 Ulsan Petroglyph Museum
울산 언양에는 선사시대의 숨결이 담긴 반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는 손에 쥔 도구 하나로 단단한 바위에 고래와 사슴, 사람과 사냥의 장면을 정성껏 새겨 넣었습니다. 그 오래된 바위그림은 여전히 제자리에 남아 당시의 삶과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방대한 분량의 조선실록 등 무엇이든 남기기를 좋아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암각화는 어찌 보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정보 저장 방식 인 셈이지요.
현재 우리는 종이, 자기 테이프, CD, USB를 넘어 구름 (클라우드) 위에 모든 걸 맡기는 세상이 되었고 작은 칩 안에 담기는 정보의 양과 이를 처리하고 전달하는데 걸리는 짧은 시간을 보다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정보 혁명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을 이끌고 있는 두 축은 인공지능과 양자 정보이며, 이 두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으로 세상이 들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양자 정보’란 게 사실 저장시간이 고작 수 초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버틴 암각화와 비교하면, 기술 발전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갸웃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건, 수 초 정도의 짧은 찰나 속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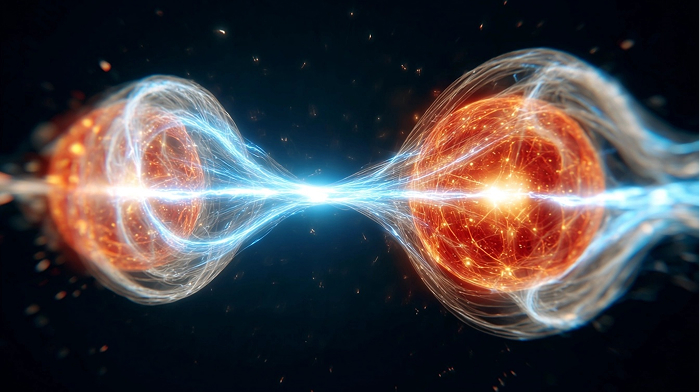
양자 정보는 기존의 정보 기술처럼 단순히 '더 빠르게, 더 많이'가 아닙니다. ‘큐비트’라는 새로운 정보 단위를 통해, 정보는 0이나 1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닌 여러 가능성의 상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정보 처리, 전달, 측정 개념을 제시합니다.
물론,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실상 실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소재, 소자위에 미세한 패턴을 새기고 하는 일들은 단단한 바위에 그림을 새기는 노력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때론, 오래전 암각화를 새기던 이처럼 ‘지금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오해와 핀잔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옛날 누군가가 돌에 남긴 삶의 기록이 지금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듯이, 우리가 남기는 실험과 기록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로 들리게 될 거라 믿습니다.
quantum wave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 만드는 물결이 멀리 멀리 퍼져 나가기를 꿈꿉니다. 이 작은 시작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집 위원 소개
-

김제형
quantum wave 편집위원장, 울산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만들어내고, 다루고,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두운 실험실에서 작은 현미경을 통해 가장 작은 빛을 내는 나노스케일 양자광원을 연구하고 있다. 본인 연구가 거대하고 매우 밝은 천체를 원거리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천체물리와 극단적으로 다른 스케일의 영역이지만 결국에는 둘다 화면에 보이는 빛나는 점하나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참 닮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천체물리 실험 기법이 양자광학 연구에도 도움이 되었듯이 언젠가는 천체물리실험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quantum wave 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이며, 해당 웹진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서로 간에 더 많이 연결되길 희망해본다. -

이선경
quantum wave 편집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표준과 기반 기초과학을 책임지는 KRISS 양자기술연구소 양자정보네트워킹그룹에서 양자광학기반 양자정보과학기술을 연구를 있다. 이 웹진을 통해 양자정보과학기술 분야 전문 과학자들과 예비 과학자들의 소통이 활발한 장이 열릴 수 있길 기대한다.
-

김준기
quantum wave 편집위원,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양자정보공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온포획 양자공학 연구실(Quantum Engineering with Trapped Ions, QuETI Lab)에서 포획된 이온을 이용하여 확장 가능한 양자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실 밖에서는 딸·아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한다.
quantum wave를 통해 양자 기술에 관심있는 청소년과 대중이 한층 친숙하게 양자세계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오창훈
quantum wave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양자정보 및 양자컴퓨팅 이론 연구자로 양자정보 및 양자컴퓨팅 전반에 관한 이론 연구에 관심이 있으며, 특히 양자 광학 기반의 물리계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 이득에 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

강동연
quantum wave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 선임연구원
빛과 전자의 가장 미세한 속삭임을 들여다보는 실험실에서 ‘Quantum Optoelectronics’를 주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광자와 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자 세계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엮어나가는 중이다. 현재는 고체점결함, 특히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스핀 큐비트들을 도구로 삼아, 세상의 양자컴퓨터들을 서로 잇는 실타래의 아주 작은 한 가닥을 맡고 있다는 마음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나노미터 세계에서 시작된 신호가 결국 전 지구적 규모의 양자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기를 꿈꾼다. 양자 컴퓨터 하나하나가 혼자 빛나는 별이라면, 이 별들을 연결해 별자리로 만드는 일의 한 조각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quantum wave 편집위원으로서, 한국 양자정보 연구자들의 시선과 생각들이 더욱 선명하고 다채롭게 기록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허준석
quantum wave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화학과/양자정보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허준석 교수 연구실은 양자컴퓨팅 이론화학 연구실(QCTC Lab)로,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분자 모델링·계산화학·수리 과학 응용 알고리즘 개발에 주력한다. 허교수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화학 학사 학위를, 독일 뮌헨공과대학교에서 계산과학·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 후 2011년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분자 진동 스펙트럼과 양자 광 샘플링(가우시안 보손 샘플링)을 연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7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에 재직하며 양자알고리즘 연구 기반을 다졌다. 현재는 양자 알고리즘의 화학·물리·생물학과 조합론적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Xanadu Quantum Technologies 방문과학자 등 학·산 협력을 통해 양자컴퓨팅 기술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

임향택
quantum wave 편집위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
비선형 결정에서 자발매개하향변환(SPDC) 과정을 통해 얽힘 광자쌍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양자물리학의 근본적인 원리들에 대해 탐구하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얽힘 광자쌍을 이용하여 빛을 이용한 양자컴퓨팅 및 시뮬레이션, 양자통신 및 네트워크, 그리고 양자센싱 및 양자계측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박지용
quantum wave 편집위원, 국립한밭대학교 기초과학부/응용광학과 교수
대전 유성에서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 양자계의 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이러한 특성이 양자정보처리와 맺는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quantum wave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며, 양자과학의 매력을 나누고자 한다. -

채은미
quantum wave 편집위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부교수
레이저를 이용하여 분자를 절대 영도 근처의 극저온 영역까지 냉각하고, 이 때 나타나는 다양한 양자 역학적 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분자의 양자 상태를 제어함으로써 양자 컴퓨팅/양자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화학 반응을 양자 역학적으로 제어하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그 시작은 여러대의 레이저가 다채로운 색감을 만들고 있던 한 연구실의 풍경에 반해서 빛을 이용하여 물질의 양자 상태를 제어하는 실험 분야에 몸담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색깔의 레이저를 참 좋아한다. quantum wave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매력적인 연구를 알아갔으면 한다.
-

인용섭
quantum wave 편집위원, 국방과학연구소 3연구원 1부 팀장
양자 기술은 고전 시스템이 가지는 계산 및 측정 한계를 양자 역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간 활용 뿐만 아니라, 군 활용을 위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군 활용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양자 센싱과 무선 양자암호통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13년 (미) 택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원자분자광학에 관한 연구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포항공과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과 연구교수로 일했고,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하여 현재는 제3기술연구원 1부 1팀(양자기술) 팀장을 맡고 있다.
-

박권
quantum wave 자문위원,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교수
개별 입자의 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전체 시스템의 행동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는 양자 다체 문제 quantum many-body problem를 연구하고 있다. 2000년 뉴욕주립대학교 스토니부룩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에서 J. K. 재인 Jain 교수의 지도 하에 합성 페르미온 composite fermion에 관한 연구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예일대학교 Yale University와 메릴랜드대학교 칼리지파크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영화를 무척 좋아해서 고등학교 시절, 물리학자와 영화 평론가 사이에서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했다. 박사 과정 때 그린 합성 페르미온 이론을 설명하는 만화는 응집물질물리 학계에서 유명하다. 주요 저서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가 있다.
-

서준호
quantum wave 편집위원,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양자하이브리드 연구실 (Hybriq Quantum device Lab; HQL)에서 양자세계의 떨림과 울림을 탐험하고 있다. 고체 진동의 양자(포논)가 빛, 전자,초전도체 등과 함께 껴울리며 양자 정보를 이어주고 양자세계의 작고 작은 힘들을 느끼게 해주는 양자 소자가 주된 연구주제이다. 연구의 결과 얻게 될 양자세계의 떨림과 울림을 잇는 소자기술이 중력과 양자물리의 경계에서 물리학 탐구에 기여하길 소망하고 있다.


